연도별 출생자수 남녀성비와 OECD 평균출산율
아래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2012년부터 2021년까지의 출생자수 데이터입니다.
아래의 데이터를 보면,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출생자수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2년의 출생자수는 410,800명이었으나, 2021년에는 423,700명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성별과 연도별 출생자수, 그리고 남녀성비 ▼
목차
<출생자수 연도별 통계 >
출처: 통계청, 출생통계
2012년
남아: 218,400명
여아: 192,400명
합계: 410,800명
남녀성비: 113.6
2013년
남아: 213,300명
여아: 190,600명
합계: 403,900명
남녀성비: 111.9
2014년
남아: 435,435명
여아: 394,168명
합계: 829,603명
남녀성비: 110.5
2015년
남아: 438,420명
여아: 396,287명
합계: 834,707명
남녀성비: 110.6
2016년
남아: 406,243명
여아: 365,182명
합계: 771,425명
남녀성비: 111.3
2017년
남아: 357,771명
여아: 321,206명
합계: 678,977명
남녀성비: 111.4
2018년
남아: 326,822명
여아: 293,122명
합계: 619,944명
남녀성비: 111.5
2019년
남아: 302,676명
여아: 274,056명
합계: 576,732명
남녀성비: 110.5
2020년
남아: 272,400명
여아: 247,900명
합계: 520,300명
남녀성비: 110.0
2021년
남아: 221,600명
여아: 202,100명
합계: 423,700명
남녀성비: 10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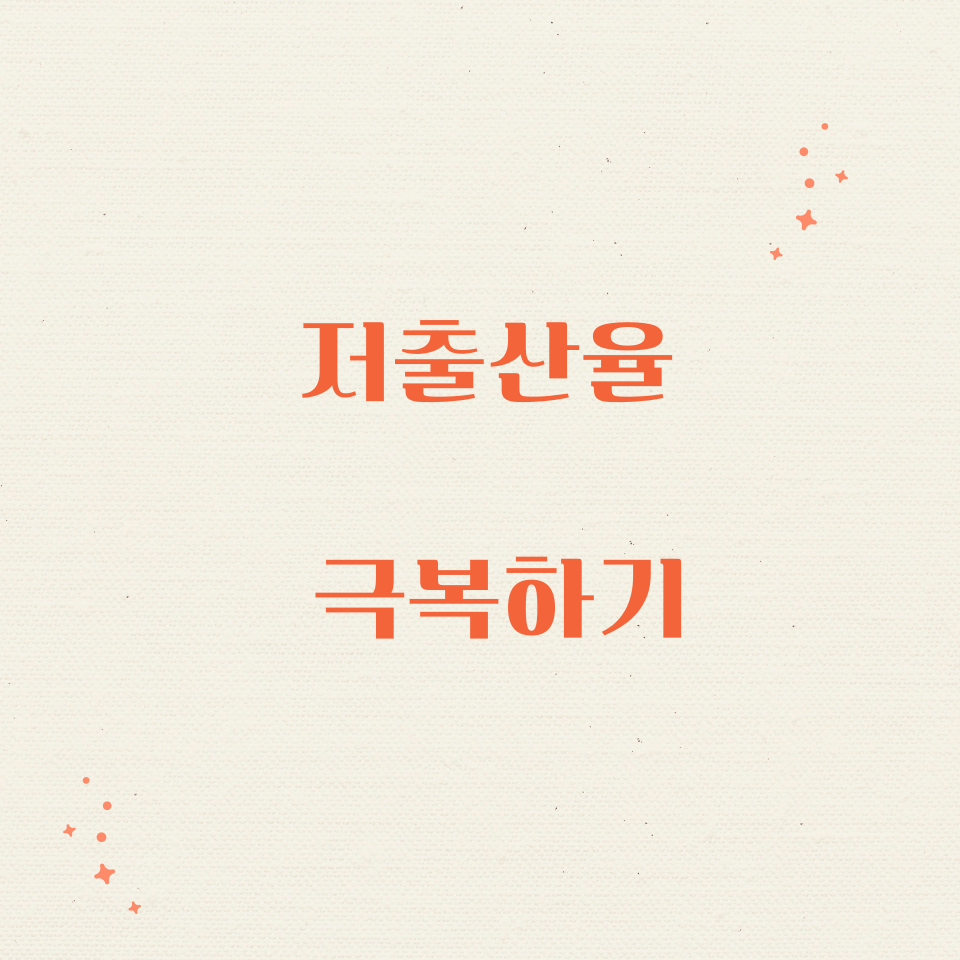
이처럼 한국의 출산율은 현재 OECD 최저를 나타내고 있고 다양한 요인이 작용
그 이유의 대표적으로는 경제적인 부담이 큰 요인 중 하나입니다.
한국의 경우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고령화가 증가하면서, 노인복지 비용이 증가하고, 노후보장체계도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모들은 자녀를 양육하는 경제적 부담이 크다고 느끼게 되어 출산을 미루거나, 아예 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취업 여건 및 여성의 사회 참여율의 증가가 출산율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직업과 가정 양립을 위해 출산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더해, 결혼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압박이 줄어들면서, 아이를 가지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경제적 이유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출산을 자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주거비용 상승, 무직자 및 불안정한 일자리, 대출상환 등의 부담 등이 그 예입니다.
교육 및 직장 환경
고등교육 및 직장 생활 등의 환경이 향상되면 여성들이 출산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경력 중심의 직장 문화와 출산 후의 경력 복귀가 어렵다는 인식이 여성들의 출산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가족 체계
혼인율 감소와 가족 체계의 변화로 인해 가족 구성원 수가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부모들의 노년에 대한 부담과 돌봄 인프라 부족 등으로 인해 출산을 미루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출산을 극복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다음과 같은 방안들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정책적 지원: 정부에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산 전후휴가 제도 강화, 주거지원 제도, 저소득층 지원, 돌봄 인프라 확충 등입니다.
직장 환경 개선: 직장에서 육아 휴직 및 유연한 근무 시간을 제공하여 출산 후 경력 복귀를 촉진하는 등의 제도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교육 환경 개선: 교육 시스템에서 출산을 지원하는 교육 및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출산 후 경력 복귀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문화적 변화: 문화적인 변화를 통해 출산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산 및 육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조성하고, 공공장소에서의 유아 시설 확충 등입니다.
이러한 방안들을 종합적으로 적용하여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